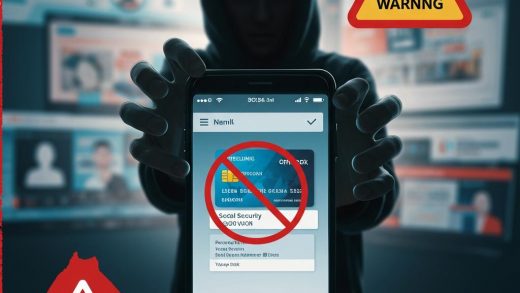디지털 트윈, 이상인가 현실인가: Uare.ai의 등장과 ‘고통의 연결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Uare.ai가 최근 1030만 달러의 초기 투자를 유치하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자아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기억, 경험, 목소리를 학습하여 실제 사용자와 유사하게 소통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개인 AI’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과연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까요? SF 소설에서 경고하는 ‘고통의 연결점(Torment Nexus)’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디지털 자아, 유산인가 속박인가
Uare.ai는 사용자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 유산 보존, 멘토링 확대, 창의성 증진, 지식 수익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디지털 자아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던 Eternos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디지털 자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개인의 디지털 트윈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SF가 경고하는 미래, 현실이 되다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나 그렉 이건의 ‘순열 도시’와 같은 디스토피아 SF 작품에서는 디지털 아바타나 AI 복제본이 등장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을 경고합니다. 알렉스 블레치만이 만든 ‘고통의 연결점’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SF 작품에서 경고하는 기술을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현실에 구현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의 ‘고통의 연결점’
우리는 종종 SF에서 경고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정부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자발적으로 CCTV,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 트루먼은 자신의 삶이 TV 쇼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에 공개하며 ‘자발적인 감시’를 즐깁니다.
끊임없는 선택, 만들어지는 미래
소프트웨어 CEO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편의, 조급함, 야망, 지루함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Uare.ai의 기술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AI에게 대체되는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Uare.ai의 디지털 자아 플랫폼은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연결점’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면서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